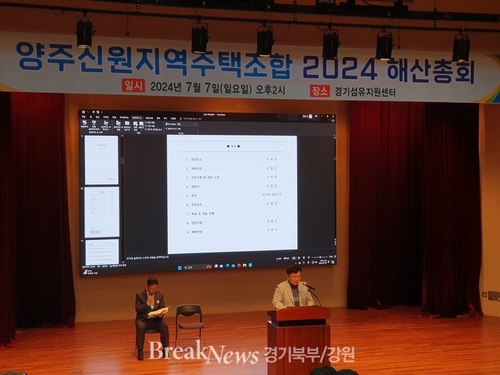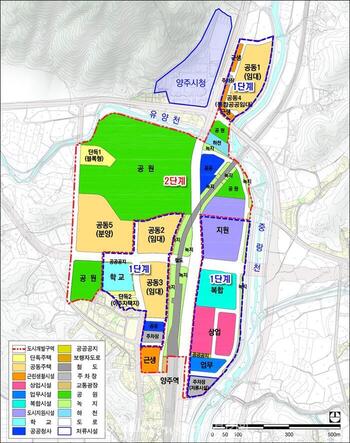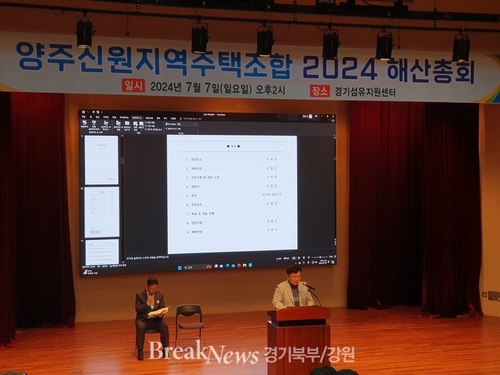|
안개 낀 새벽, 마치 공명(空冥)으로 회절무늬와 같이 떠나간 소녀의 얼굴이 그려진다. 내 어머니의 고단한 일생과 이것이 당신과 나의 마지막 인연이라는 말로 시작된 메일과 벽에 이마를 기대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던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는 이것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변경할 수도 편집할 수도 없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를 다만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적절한 순간에 출력하여 왔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어제 오후부터 구름이 도시와 철탑 사이에 흐린 날을 뿌렸다. 가로의 입간판과 전선들이 뿌연 바람소리를 냈다. 무한히 많은 입자의 운동을 계산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혀진 아침에도 나는 차트를 정리하고, 분석한 다음 몇 가닥의 상념을 손톱으로 건드린다. 그것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일 때 조용한 아침은 원자의 강력(强力 : strong force)에 붙잡혀 있는 전자와 같이 나의 기억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혹은 그것들을 잊기 위해 선로(線路)를 달렸다. 달린다는 현상은 눈부시지만 그것이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자(電子)들은 관측장비를 들여대는 순간 마치 지능을 지닌 존재처럼 카메라를 의식한다. 양자역학에서는 그러한 입자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었다. 그들의 속도를 알려하면 위치가 불분명해지고, 위치를 알려하면 속도가 불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하이젠베르크(Heisenberg 1901~1976)의 실험실에서 입자들은 속삭였었다. 결국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근대 프랑스 수학자였던 라플라스(Pierre Simon de Laplace 1749 ~ 1827)는 이렇게 말했었다. “자연의 모든 것은 법칙에 따른다. 우연히 분 바람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가벼운 먼지의 움직임도 사실은 유성의 괘도처럼 명백한 방식의 법칙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 그 모든 것을 분석할 만큼 폭넓어진다면 우주의 가장 커다란 부분에서부터 가장 미소한 원자의 움직임까지 모두 동일한 하나의 공식으로 포착될 것이다. 이러한 존재에게 불분명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이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눈앞에 보듯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론적(決定論的) 서술에서는 우연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신비라는, 설명될 수 없거나 수치로 환원될 수 없는 불분명한 함수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확고부동한 필연성에 따라 서술되는, 수신자에 의해서는 수정될 수 없는 공보(公報)와 같은 것이고, 그 공보에는 필연이든 우연이든 그것이 경험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의 이성으로 직역될 수 있는 것이라고 기술되어 있었다. 각각의 존재들이 지닌 가치나 의미, 또는 의지 등을 비롯하여 사고, 감정, 신념 따위의 사항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믿음만큼 오래되고 뿌리 깊은 것이기도 하다. 되도록 단순한 원리를 통하여 인간의 삶을 서술하고 싶어 했던 과거의 현인(賢人)들과 같이 라플라스에게 있어 세계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공식에 따라 배열된 무수한 입자의 진열에 불과한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공식이었다. 하나의 공식으로 세계를 서술할 수 있다면 역사란 일정한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리량과 같은 것이 되리라. 물리량으로서 역사는 사건 지평선 너머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이나, 에너지와 물질의 변환이나 은하와 은하 사이에 묶여 회전하는 구름이라든가, 이름 없는 행성에서의 지질학적 연대기에 자기복제의 능력을 지닌 물질의 출현이나 그들이 이루어낸 여러 상이한 변조와 물결치듯 일어난 경쟁과 도태, 그리고 반란을 꿈꾸다 처형된 이들의 조서(調書), 또는 실권자가 처형된 아침, 혁명지에 게재된 사설을 비롯하여 개혁정책의 입안과 폐기, 상황과 조건에 따라 부침하는, 또는 한 인간의 상승이나 몰락과 같은 일체의 모든 것이 최초의 행렬 속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각 항의 조건 민감도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주의 전체 과정을 알아낼 수 있다고 믿는 가역의 역사이기도 하다. 전체 과정을 손에 쥐고 있는 역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순차(順次)의 대입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사건은 필연성 외에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에 관한 정교한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떤 과정에 의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판독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대부분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 다만 우리가 그러한 필연성을 예지(豫知)를 할 수 없는 것은 각각의 항목에 대입할 자료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연산하는 일이 어려울 뿐이라는 것이 라플라스의 생각이었다. 하이젠베르크(Werner Karl Heisenberg 1901~1976) 라플라스의 결정론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대체되었지만, 그것은 보다 복잡한 공식으로 같은 현상을 다르게 설명하는 일종의 치환(置換)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어진 한 지점에 참여하는 구성입자들의 파동함수(wave function), 또는 확률변수(random variable)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예견할 수 있으며 서술할 수 있다는 뜻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안에 내포되어 있고,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확률은 그 조건을 서술하는 파동함수의 과거값으로부터 완전하게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기술하는 언어는 결코 자유롭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느슨한 언어가 아니다. 이것은 21세기 권력구조처럼 보다 정교하고 내밀한 통제를 통하여 시민의 삶 일반을 기획하고 제어하는 미셀 푸코식 메커니즘과 닮았다. 우리는 어떤 해제를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세계의 질서에서 발췌하여 벽보처럼 생의 여기저기에 붙여두었다. 인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원리를 조금도 알지 못했던 시절, 유년시절의 나는 아이들과 노는 일을 재미있어 했다. 까마귀가 나는 하늘에 구름은 아무렇게나 떠다녔고, 들녘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커다란 포물선을 그렸었다. 그 때는 정말 아무 것도 알지 못했었다. 우리가 삶으로 체득하는 정보는 우리를 간섭하고 결정한다. 사회는 각 개인에게 모종의 모듈을 부과하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회에 의해 판정되고 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법칙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자연법칙(natural law)에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베르그송(H. Bergson 1859 ~ 1941)은 말했었다. 사회는 우리에게 우리가 위치할 곳을 지정하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맡겨진 업무를 처리하도록 종용한다. 뒤르케임(Emile Durkeim 1838 ~ 1917)도 같은 생각을 지닌 학자였다. 시몬느 보봐르(Simone de Beauvoir 1908 ~ 1986)는 샤르트르에게 “인간의 실존적 자유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관념(사회적 조건)의 구체적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다른 말로 기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사는 일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식생산자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대중의 삶과 그 기법을 지배하려는 권력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주관으로부터 도안(圖案)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의 주관적 진술이며, 객관적 사실로부터 우리의 내부에 위임된 통각(痛覺)의 다름 아닌 것이다. 객관적 사실을 기술할 수 없는 이에게 고통은 개인적으로 서술될 수 있는 용법이 아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에게 고통이 있을 리 없다. 그 때의 고통은 바라보는 이들의 눈에 비친 고통이다. 감각이 마비된 이에게 현실은 허상(虛想)과 같다. 또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순교하는 이에게 내려지는 체형은 그에게는 신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같은 것이다. 세계에 대한 표상이 존립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의 일관되고 유의미한 주관이 생겨난다는 것은 부당한 논거이며 무책임한 변론이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식하고 판독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우리의 주관을 진술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말할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객관의 세계에서 주관을 빌려올 뿐이며, 객관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주관은 진술 가능한 어법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自我)”라는 것은 본래 거짓이거나 허구이며, 객관이 우리의 지각이나 표상 속에 유지되고 지속되는 동안 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혹은 반응하도록 강요된 다만 언어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해했던 세계(cosmos)는 카오스(chaos)로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에 의해 유도된 안정된 디자인이며 그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cosmos는 파토스(pathos)적 열정이나 들뜸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으며, 인간은 그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역사와 더불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 무너지며 재편되어 왔던 세계관으로서의 우주기계체계(宇宙機械體系)는 그리스가 제공한 cosmos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 디자인은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에 의해, 라플라스에 의해,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변함없이 그대로 전승되어 우리에게 언표되었다. 가역적이며 대칭적인 시공이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든, 비가역적이며 프랙탈적 시공이 사상의 지대(地帶)를 이루든 그것은 혼란과 불신과 위선과 무관심과 분열의 세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변화의 확실성(certitude)을 의심하지 않으며 입력된 바와 출력되는 바가 인과적 관계 아래 설명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확신한다. 지식생산자들에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지각되는 것과 지각하는 것의 패턴을 해석하여 세계의 전단계(全段階)를 해석하려는 생각은 그들의 권력의지를 강화시킴과 아울러 그들의 정서를 유쾌하게 하였다. 물론 신(神)은 그러한 유쾌함을 위해 필요한 존재였다. 그 모든 인과의 원인을 풀어주는 제 1 원인으로, 또 세계가 엔트로피의 극단에 위치할 때 처음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존재로 요청되었다. 라이프니츠(G.W. Leibniz 1646 - 1716)는 신이 창조한 세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가끔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이라면 세계의 창조자인 신 또한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논거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그의 불쾌는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수학적 아름다움이 훼손되는 자체에 있었고 그것은 다른 대부분의 지식생산자의 그것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들은 신이나 세계(cosmos)도 역시 우리의 지각과 표상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제작된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만 여러 반응과 지각 사이에서 아름다운 유쾌와 지저분한 불쾌를 뜰채로 걸러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봄이 오고,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도로에는 자동차가 특유의 소음을 내며 달리고, 사람들은 가느다란 입자처럼 인도 위를 걸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선서를 하는 장면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우연은 필연의 다른 이름일 수 있고, 필연은 우연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일은 5.16이 일어난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미래에 일어날 확률은 그 조건을 서술하는 파동함수의 과거값으로부터 완전하게 결정된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말처럼 이미 예측 가능한 것이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sang1475@naver.com *필자/푸른달빛.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