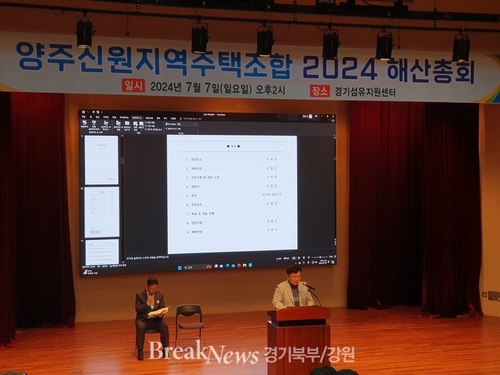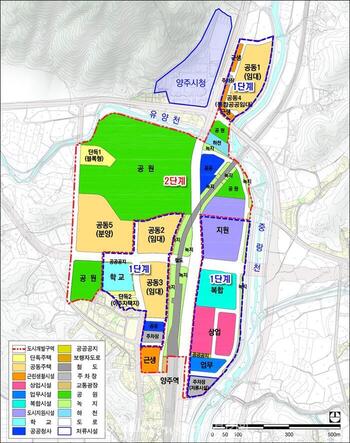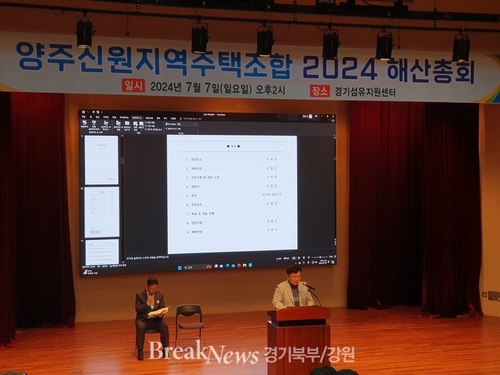|
새벽, 맹렬한 한기가 쟂빛 섞인 짙은 푸름으로 아직은 캄캄하고도 짱짱한 하늘로부터 사정없이 내려 산을 덮는다.
山寺의 대웅전 지붕너머 실낱같이 흰 그믐달이 더욱 새하얀 샛별과 함께 가슴 시리도록 간결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달은 거기 그대로 억만 겁 둥글게 있을텐데도 눈썹같은 초승달이었다가 반달이었다가 피라미트나 파르테논 신전조차 위압하는 경이로운 수퍼 문이었다가 오늘 새벽 문수산 법륜사 대웅전 위의 신비스럽도록 하얀 샛별과 함께 표표히 떠가는 실같은 돛배가 되어 보이기도 한다.
우주와 생명, 삼라만상의 모든 참 진리는 억만 겁, 그 이상으로 이미 달처럼 거기에 그대로 있어 온 것이리라. 이처럼 그런 참 진리를 깨우침이 바로 니르바나이고 피안(彼岸)이 아닐까? 그 마저도 환(幻)일 수도. 오후, 길 건너 또 한 곳의 산기슭에 노루 빛 성탑처럼 보이는 수녀원 병원이 있다. 그 앞의 작은 텃밭에서 한 수녀가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하며 마른풀더미를 치우는듯한 실루엣의 움직임을 아까부터 반복하고 있다. 애매한 그 시간 거의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차를 기다리며 나는 고즈넉한 길 건너 멀리의 그 광경을 보고 있다. 이즈음 같은 시간 낯 선 곳 이런 오후의 정경 속에 뜻밖에도 내가 앉아 있다. 그 정경 속에서 오후의 햇살도 칼바람의 겨울에는 속수무책 인 듯 머쓱해 진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누군가가 이틀 전부터 갈색방석을 슬며시 갖다 놓아 준 나무 벤치를 버리고 깃을 올린 채 걸어보며 법화경의 한 구절들을 외우고 있다. 이제 2주만 지나면 이런 정경 속의 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나를 태우러 올 버스가 산 아래 종착점 쪽으로 지나간다. 몇 군데 정류장을 지나 산 아래 종착점을 돌아서 다시 내가 기다리는 정류장으로 돌아올 셈이다. 길 건너 멀리에서 마른풀 더미를 치우던 그 수녀가 허리를 펴고 그 버스를 본다. 그리고 곧 주변에 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고 담장도 없는 수녀원 텃밭을 나와 산골 찻길의 아스팔트를 건너 내가 있는 쪽으로 온다. 겨울인데 밭에서 무얼 하세요? 얼어붙는 바람에 추위를 잊기 위해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본다. 덤불이 있어서요 의외로 나이 지긋해 보이는 작은 키의 수녀는 참으로 쾌활한 음성을 지녀 시원스러웠다. 버스를 타시려구요? 그런데 그 멀리에서 그렇게 태연하세요? 수다스러울 정도로 또 말을 걸어본다. 이제 지나가면 몇 분 만에 여기 오는지 알거든요 수녀의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겨울 하늘을 잠시 제압한다. 정말 신을 확신 하세요? 그러나 그 질문은 하지 않는다. 수녀님의 천주님은 수녀님의 몫이다. 부처님이 이제 확실히 나의 몫이듯. 파티마의 기적 역시 바티칸의 몫이다. 고요한 공적함이 오히려 조화로운 아름다운 정토 역시 나의 선택이다. 이미 있어 온 모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바티칸과 수녀님의 천주님에게 천국의 열쇠와 기적이 있다면 모든 불국정토에는, 그리고 문수산 법륜사에는 살아계신 부처님의 대자비와 살아생전 스스로 무위(無爲)를 깨우침으로 행복하고도 아름다운 정토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주지 현암 스님의 꿈다운 꿈과 수월관음 보살의 미소가 곧잘 오버 랩 되는 원력이 있다. 새벽 3시 50분에 아직 찬 물을 끼얹는다. 곧이어 문수산 법륜사의 범종이 울리고 나는 불을 밝힌다. 수백만겁 전부터 있어 온 새벽은 매번 단 한 번도 똑같지 않은 갖가지 모습으로 언제나 어김없이 다가오고 꿈처럼 사라진다. 그리고 이리도 차디찬 겨울임에도 대웅전 아득한 돌부처님의 몸과 미소와 그윽한 눈길에서 분명 살아계심의 온기를 나는 매번 확인한다. 흔들림 없이 평안하다. inioh@naver.com *필자/오정인(定引華) . 소설가. 칼럼니스트.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경기북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